천현우의 <쇳밥일지>(문학동네, 2022)는 불운했던 한 청년 용접공의 성장기를 기록한 일기이다. 어찌 이다지도 운이 없었을까, 개탄하며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주간경향에 연재했던 걸 개고하여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작가 천현우는 두 살 때 고향 마산을 떠나 여덟 살 때 다시 마산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다 상도동 집 한 채를 통째로 날려먹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생모는 아니나 가슴으로 낳고 기른 심여사가 이혼과 함께 작가를 데리고 마산으로 왔다. 두 모자는 보증금조차 없어 산호동의 국제여관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다.
"열아홉 살 무렵엔 어시장 부근 신포동 지하방에서 살았다. 아주 어수선한 동네였다. 만취한 노인들의 고성방가,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노래방, (···) 요란한 빛깔 네온사인의 홍등가까지. 몰락한 산업도시의 번잡스러움을 고스란히 전시해 둔 장소였다."
- 쇳밥일지 프롤로그 중에서
작가 천현우는 틈틈이 알바를 하며 경남마산전자고등학교를 나와 창원기능대를 졸업했다. 주야교대 68시간 170만 원의 공장 일도 경험했다. 산업기능요원을 하며 잔업, 특근 막일 가리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이자 장사를 하던 심여사는 8천 원 만원을 떼였다. 신용회복 위원회 구제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작가 천현우 프로필
전문대를 졸업한 후부터 공장에서 쉴 틈 없이 일했다. 틈틈이 소설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승률은 0승 17패. 글쓰기를 포기하려 할 때쯤 언론을 통해 글 쓸 기회가 찾아왔다.
2021년부터 <주간경향>, <미디어오늘>, <피렌체의 식탁>, <조선일보>에 칼럼을 기고했다. 현재 미디어 스타트업 alookso에서 일하고 있다. 인생 계획이란 로또 당첨 번호를 분석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중이다. (작가의 말)
쇳밥일지에 대하여

쇳밥일지를 읽어보면 내가 막연히 느끼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대한민국에는 두개 의 다른 세상이 있는 듯하다. 이 책을 읽고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놀랐다.
첫째는 작가 천현우가 1990년생이라는 점이다. 그가 자란 성장 배경이 1950~60년대 생 같았는데, 작가가 1990년생이라는 걸 알고 많이 놀랐다. 그의 성장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꼭 칠팔십 대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저리도 불우한 세계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작가는 옛날 사람들처럼 문장도 " ~~ 할 터."라든가 "~~ 마련." 등으로 자주 마침표를 찍었다. 나만의 감별법이긴 하지만 문장을 ~~ 터.로 끝내면 글쓴이는 거의 백퍼 60대 이상이거나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걸로 보면 된다. 특정 어휘의 빈번한 사용은 특정 세계관을 반영하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럼에도 작가가 망가지지 않고 성공하여 지금은 유력 일간지에 칼럼도 기고하고, 미디어 스타트업에 기자로서 취업했다는 점이다. 작가 천현우는 열심히 살았고, 엄혹한 청년기를 뚫고 마침내 성공했다. 쇳밥일지에서 말하는 그의 인생 이야기는 성공 신화나 다름없다.
그런데 책을 덮을 때쯤 작가의 이야기에 회의감이 들었다. 어렸을 적 친구들 중에는 기계공고를 다닌 애도 있었고, 대부분은 기능대학은커녕 중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장에 일하러 갔다. 내가 둔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서 작가 천현우와 같은 울분이나 좌절감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들도 그 시기에는 불행하다고 느꼈을까?
아무튼 작가 천현우는 나름 성공하여 용접봉을 던져버리고 펜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말대로 쇠락한 도시 마산을 벗어나 상경하여 기자가 되었다.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의 용어로는 '먹물을 먹으면') 죄다 서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일까?
작가가 꿈꾸는 세상은 가부장적인 60~70세대가 꿈꾸었던 세상과 거의 똑같다. 남자는 바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림을 사는 것 말이다. 이 책 에필로그에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고도 했다. 금의환향도 아마 그의 꿈일 것이다.
“계급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지난한 현실 속에서도 지방 총각들은 가정을 꿈꾼다. 내 차를 타고 퇴근해, 내 집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를 맞이할 아내와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면서”(작가 천현우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마지막 문장)
작가는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 울분을 토하지만, 자신이 처해보지 못한 약자에 대한 감수성은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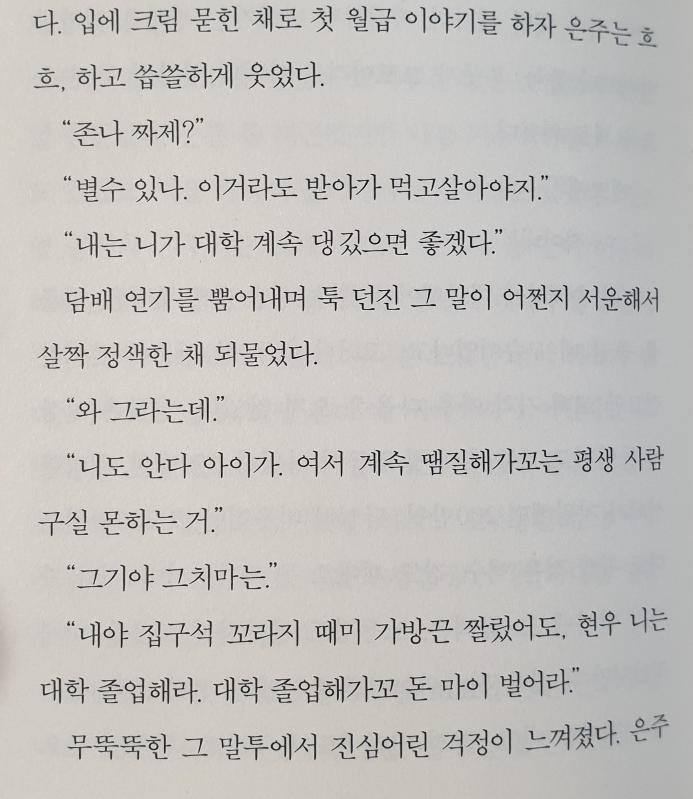
작가는 여자 친구였던 은주 씨와 초원 씨 이야기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작가의 젠더 감수성을 볼 때 두 분에게 동의를 받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작가 천현우의 이야기는 청년공이라는 희소성에서 힘을 발휘한다. 희소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의 글들이 소비되는 성향도 있지만, 또 지방을 탈출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크지만 그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귀담아들을 가치는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