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정의 몸과 빛, 죽음 이후마저 슬픈
소설가 위수정의 단편 <몸과 빛>은 주인공이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바로 그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가끔 푸른빛이 어슴푸레하게 도는 새벽녘에 불현듯 눈을 떴을 때 내가 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곤 한다. 끔찍한 순간이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돌아온 임사체험은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 되었다.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췄다가 구사일생한 사람들은 많은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며 환한 빛을 따라갔다거나 죽어 널브러져 있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경험담을 늘어놓는다.
의료계에서는 죽음 직전에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흥분된 상태에 발생하는 뇌파의 하나인 감마파가 증폭한다는 현상을 관찰했다. 임사 체험담은 그들이 본 것이 사후세계인지 흥분한 상태의 특이한 뇌 현상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다. 완전히 죽어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여태껏 없었으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의 신뢰성을 증명할 길도 없다.
위수정의 몸과 빛은 사후세계 체험담이 아닌 작가적 상상력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의 사후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황정은의 단편 <대니 드비토>의 주인공은 펭귄맨이었던 배우의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생각한 순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이 소설 <몸과 빛>의 주인공은 자신의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깨닫게 된다.
작가 위수정 소개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천천히 죽어가는 인생과 그 사이에 출몰하는 사랑의 숙명을 중편소설 「무덤이 조금씩」으로 등단했다.
그 후 사 년 동안 부지런히 써온 여덟 편의 작품이 묶은 <은의 세계>(문학동네, 2022)를 출간했다. 위수정은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어딘가를 움직이는 작품을 좋아한다.
<몸과 빛>은 2023년 현대문학상 최종후보작에 올랐다.

위수정 몸과 빛 줄거리
'나'는 어느 날 낡은 1톤 트럭에 치여 피를 흘리며 도로에 누운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서서히 깨달아가며 어리둥절해한다. 주인공은 수면제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던 길이었는지 누군가의 생일이라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는지 헷갈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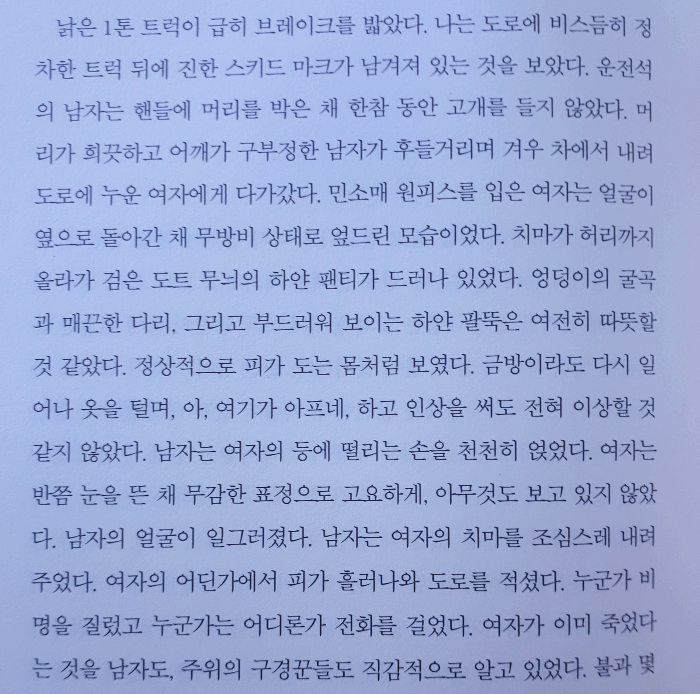
주인공은 처음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바람에 허둥지둥 내려 눈물이 멈출 때까지 인파를 피해 구석의 벽을 보며 서 있던 시간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트럭 운전수를 지켜본다.
주인공은 만약에 자신이 자살을 해도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도로에 뛰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트럭 운전수에게 미안함을 갖는다.
그녀는 새벽녘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트럭운전수가 그의 집이 있는 오래된 빌라 옥상으로 가는 길을 쭉 따라간다. 주인공은 옥상에서 하체는 없이 상체만이 땅에서 몇 센티미터 떠 있는 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는 문수였다. 아니 문수가 아닐 수도 있다.
문수, 점점, 나 연해져. 남자는 완성된 문자장으로 말하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하체를 가리켰다. 까먹어요, 자꾸. 그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름이 문수? 그제야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나는, 나는·····지숙. 그게 내 이름이 맞는지는 나도 몰랐다.
- 2023 현대문학상 소설집 172쪽
위수정 몸과 빛 독후감
그 후 주인공은 자신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가족들 얼굴이 가물가물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져왔고, 그녀의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떨어져서 지켜보게 된다.
문수는 마지막 남은 팔마저도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고 얼굴도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는 눈동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다 잠시 후에 문수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의 손도, 손목도, 팔도 희미해졌고, 문장도 잊어간다는 사실을 느꼈고 시간과 공간도 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라지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만지고 싶다는 생각, 몸을 섞고 피부와 체온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으로 발음할 단어를 겨우 이해한다. "잊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었다."
작가는 결국 희미하게 사라져 가는 순간에도 '살고 싶었다'는 주인공의 욕망을 발화하며 끝맺는다. 황정은의 <대니 드비토>는 죽음 이후에 무한의 시간으로 뻗아가다 의식이 소멸하는 데 반해 <몸과 빛>은 아주 짧은 사후세계로 응축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죽는 순간 이후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까? 아마 사람마다 선호는 다를 것이다. 몇몇 뇌과학자들은 죽기 직전,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한다.
내 개인적인 관점은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명하나, 뇌과학적으로 죽기 직전, 아주 짧디 짧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훅 스쳐 지나갈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더 이상 잡을 수 없으므로 슬프고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으므로 슬픈 일이다.
위수정은 그 아스라한 마지막 순간의 애달픔을 단편 <몸과 빛>에 담았다.
2023년 현대문학상 수상작
2023 현대문학상 수상작, 안보윤의 어떤 진심
안보윤의 「어떤 진심」은 2023 제68회 현대문학상 수상작이다. 2023 현대문학상은 2021년 12월호~2022년 11월호(계간지 2021년 겨울호~2022년 가을호) 사이, 각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 선정된다.
novel.newbinsight.com
윤보인 소설 압구정 현대를 사지 못해서, 인생은 갭투자
윤보인의 소설 압구정 현대를 사지 못해서를 읽고 압구정동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다. 소설 압구정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고군분투, 갭투자로 살아
novel.newbinsight.com




댓글